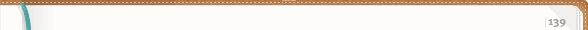
별을 쫓는 아이들은 루이제 린저의 작품이 아니었던들 선뜻 손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.
사춘기 시절 '생의 한가운데'라든가 '잔잔한 가슴에 파문이 일때','완전한 기쁨'과 같은 작품으로 익숙한 그녀의 동화는 어떤 색채가 묻어날지 궁금했던 것이다.
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 세사람의 이야기를 메르헨의 형식을 빌어 재미있게 풀어 쓴 것이다.
아마 린저는 그녀의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크리스마스날 밤 흔들의자에 앉아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해 주듯이 편안하게 이 메르헨을 썼을 것이다.
작가의 그런 느낌은 오늘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.
아기예수에게 경배를 드린 동방 박사 세사람은 어른이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들의 아들이고 딸인 어린아이들이고 그들은 오로지 신비로운 꼬리별에 의지해 각자 홀로 미지의 세계 사막으로 길을 나선다.
우연한 장소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세 아이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으나 '꼬리별'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에 의기투합을 해서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함께 하게 된다.
아마 이쯤이면 황량한 사막에서 위협에 맞닥뜨리나 기지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,다툼이 있고 화해가 있고 모험이 있는 줄거리를 기대하게 되지만 서운하게도 이 이야기엔 그런 클라이막스가 없다.
물론 약간의 갈등으로 꼬리별의 존재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시간도 있긴 했다.
그러나 전체적으로 밋밋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, 작가의 속임수나 편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책이다.
이 동화는 아마 작년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출판되었을텐데 이미 화려한 상술로 치장된 요즈음의 성탄절에 읽기엔 그 언어가 너무 명징해서 어쩌면 고루하게 느껴질런지도 모르겠다.
믿을 수 없는 기적보다는 내 손안에 던져지는 사탕 한 알에 더 현혹되는 우리이기에 뻔히 아는 이야기에 설정만 약간 달리한다고 크게 반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.
그.러.나. 새로운 왕이 권력과 나라와 군대를 가진 힘의 왕이 아니듯이 '별을 쫓는 아이들'은 거창한 볼거리는 없으나 세상의 소금과 같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마음의 동화다.
이런 책이 잘 팔리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출판을 결정한 '월간 싱클레어'도 역시 이 책의 정신과 닮은 것 같다.
이 책을 읽음으로서 우리 마음엔 이미 평화의 왕이 들어 선 것이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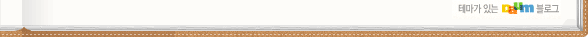
'부엌에서 책읽기 > 책장을 덮으며(book review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얘들아,고개를 들어 찬란한 태양을 보자. (0) | 2008.05.05 |
|---|---|
| 이혼 지침서 (0) | 2008.04.16 |
| 읽지말고 말해 보라 (0) | 2008.03.20 |
| 세상은 넓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많다. (0) | 2008.02.25 |
| 흰기러기 그리고... (0) | 2008.01.23 |
